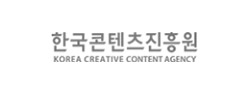[출처: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웹진 VOL. 219 2024년 6월호]

글. 정필례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KBS 무대 <결혼 방해 공작단>, <1학년 인생>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 <탐정들의 영업비밀>
앤솔로지 <토요일 오전 소설 클럽 미스터리> 출간
현재 영화사와 계약, 시나리오 집필 중
나의 집은 사람 집이 아니다. 다섯 마리의 고양이가 사는 곳에 사람 두 명이 얹혀사는 형국이다. 난 그들의 심부름꾼이자 청소부고, 남편은 그들의 캔 따개이자 오락부장이다.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다. 어릴 땐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들이게 됐는데, 그놈이 꽤 사랑스러웠다. 전형적인 수놈 치즈태비였는데, 이름을 메리라고 지었다. 당시 재미있게 봤던 <메리대구 공방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따온 것이었다. 성별대로 간다면 대구라고 지어야 했겠지만, 왠지 꺼려졌던 것 같다.
그러다 메리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보름을 꼬박 슬퍼하면서 ‘다신 키우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몇 달 후, 난 또 고양이를 데려왔다. 메리와 닮은 놈이었다. 좀 더 오래 살라는 진심을 담아 함부로 ‘삐약이’라고 이름 지었다. 언뜻 들으면 병아리가 삐약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내서 지은 이름이었다. 내 딴엔 마구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의외로 고양이 이름 중에 삐약이란 이름이 꽤 된다고 했다.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였나 보다.
그 후 난 삐약이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왔다. 남편은 나보다 더한 고양이 덕후였기에 이 털식구를 반가워했고 우린 곧 삐약이의 충실한 집사가 됐다.

고양이와 살면 많은 것들이 불편하다. 일단 검은 옷은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둬야 한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그들의 털이 섬유 속까지 박히기 때문이다. 건조기를 들일 때까진 방법이 없다. 니트류 옷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갈고리 같은 그들의 발톱이 호시탐탐 내 옷을 찢어발길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화장실 휴지를 죄다 풀어 욕실 바닥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유리잔을 발로 툭 쳐 떨어뜨려 놓고 ‘나 잘했지?’라는 눈빛으로 바라볼 땐 약이 바짝 오르기도 했다. 2박 3일 이상의 여행은 꿈도 못 꾼다. 워낙 깔끔을 떠는 앙큼한 것들이라 화장실을 매일 치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어떻게 부탁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까짓 거 무시하고 갔다 오자면 못 갈 것도 없지만, 분명 여행 내내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런데 왜 난 어쩌다 다섯 마리와 동거까지 하게 됐을까. 그건 내 의도도, 남편의 의도도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운명적으로,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본인이 관심 가는 분야에 유독 촉이 발달해 있다. 애써 공부하지 않아도 지식이 늘어나고 어딜 가도 그것만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내가 딱 그랬다.
고양이를 기른 후부터 내 눈엔 유독 고양이들이 잘 보였다. 나무 뒤에 숨은 노란 놈, 차 밑에 웅크린 고등어태비, 담장 위에 웅크리고 있다가 후다닥 도망가는 삼색이. 친구랑 길을 걷다가 내가 “어, 저기 고양이다”라고 말하면 친구는 어딘지 몰라 두리번대기 일쑤였다. 왜 내 눈엔 저렇게 잘 보이는데 못 보는 거지, 의문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이놈들도 날 알아본 모양이다. 어느 날인가, 동네에서 오가다 몇 번 만났던 고양이가 먼저 다가왔다. 번쩍 안았더니 곱게 안겨있기까지 한다. 그렇게 난 그놈을 또 집에 들이고 ‘가을’이라고 이름 지었다. 평범했던 10월의 어느 날, 벌어진 일이었다.
그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길에 돌아다니는 새끼 고양이를 구조했고, 지인의 가게에 무단 침입해 제 집인 듯 굴던 고양이를 데려왔고, 성깔 부린다며 누군가 버린다던 고양이를 들였다.

그 시간, 그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내게 와준 철부지냥이. 수많은 가게 중에 하필 내 지인의 가게로 들어온 뻔뻔냥이.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라는 유령 같은 존재에게서 내게로 온 까칠냥이. 이쯤 되니 모든 건 운명인 것 같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는 말처럼 말이다. 내가 데려온 게 아니라 그들이 ‘어서 와. 나 같은 고양이 처음이지?’라고 불러버린 주객전도의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일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얼렁뚱땅, 스리슬쩍 밀고 들어온 털식구가 내 집이 마음에 든다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들이 있어 내 삶이 더 고요하고 평화롭고 따뜻하고 풍요롭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집사가 되는 수밖에.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은행의 탄생이 ‘신의 뜻’이었다고?! (2) | 2024.08.06 |
|---|---|
| 우리 사회를 연결할 ‘브릿지’ 학생사회공헌단 성과공유회 (1) | 2024.08.02 |
| [서울의회 웹진] 서울 어제와 오늘: ‘그때 그 시절’ 서울에 빠져보세요 서울생활사박물관 (1) | 2024.07.17 |
| 방송작가 뉴미디어 저작권 법제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착수 (2) | 2024.07.16 |
| TV 앞 지키는 ‘중·장년층’ 잡아라?··· 놓칠 수 없는 ‘2049’의 지지 (2)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