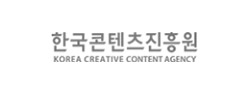불국의 정토에 나부끼는 영롱한 문장들, 동리목월문학관
- 여행
- 2022. 10. 4.

불국의 정토에 나부끼는 영롱한 문장들, 동리목월문학관
글. 윤진아 사진. 정우철
맹렬했던 더위가 자취를 감추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날, 경주 동리목월문학관을 찾았다. 시에 이끌려 찾아왔다가 소설이 읽고 싶어지는 여행길. 바람에 나부끼는 영롱한 시어 사이로 어디선가 ‘엇쇠! 잡귀야, 물러가라’는 무녀의 굿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토속감성에 민족 영혼 담은 동리
석굴암 본존불상이 지그시 내려다보는 불국의 정토 위에 목월의 시와 동리의 소설이 놓여있다. 불국사 앞 작은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돌계단을 오르면 너른 마당에 푸른 기와를 인 두 문학관이 마주보고 있다. 왼쪽이 동리문학관, 오른쪽이 목월문학관이다. 김동리와 박목월에게 천년고도 경주는 삶과 문학의 모태이자 영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초기작 <무녀도>부터 만년의 <우물 속의 풍경>에 이르기까지 동리 소설의 근원이 되었고, 목월의 시 <청노루>나 <윤사월>에도 고향의 정서가 짙게 배어있다.
동리문학관에 들어서면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푸근한 흉상이 객들을 맞이한다. 전시실 벽면의 작가 연보를 따라가면 1913년 태어나 1995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김동리 선생의 발자취가 한눈에 펼쳐진다. 20대 초반에 발표했던 단편소설 <무녀도>를 50대 중반에 장편소설로 고쳐 쓴 <을화>는 1982년 노벨문학상 후보작으로 최종 심사에 오르기도 했다.
문학관 한쪽에 재현된 서재에는 오래된 나무책상이 있는데, 창작의 고통과 희열을 수없이 오갔을 선생의 모습이 쉬이 그려진다. 김동리는 시 <자화상>에서 “나는 오랜 옛 서울(신라의 수도 경주)의 한 이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밝혔다. <무녀도>에서 무녀 모화가 살던 마을이 바로 동리의 고향 성건동 일대다. 모든 자연물과 교감하며 조화를 이뤘던 모화는 섬김의 대상을 ‘신’ 대신 ‘님’이라고 불렀는데, 신은 곧 인간의 형상이기도 하다. 소설의 결말에서 모화는 결국 물속으로 사라진다. 무녀의 죽음을 통해 작가는 식민지 근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적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오늘 아침엔 월급봉투로 연탄을 들이고
어저께는 문인협회의 위원에 뽑혔습니다(중략)
소설은 약관에 이미 당선이 되었지만
아직 어느 나무 그늘 아래도 내 마음 쉴
의자 하나 놓여 있지 않습니다(중략)
이제 나는 머리가 벗겨지고 등이 굽은 채
서울역이나 서대문 가는 전차를 잡으려고
동대문 모퉁이를 헐덕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봅소서, 이렇게 나는 오늘도 찬 바람
흐린 햇빛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 김동리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목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시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노랫가락이 읊조려졌다. 아마도 이 나라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노랫말을 지은 이가 박목월 시인이었다니! “북에 김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박목월이 있다. 김소월에게 툭툭 불거지는 맛이 있다면. 박목월에겐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맛이 있다.” 정재용 시인이 격찬해 마지않았다는 목월은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 간결한 리듬이 반복되는 민요조의 시를 주로 썼다. 1939년 등단해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활동하며 토속적인 삶과 풍경을 글로 옮겼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정갈하게 가다듬은 덕분에, 목월의 시는 노래처럼 흘러간다. 일본이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 때도 굽히지 않고 한국어로 시를 써서 마루 밑에 숨겨 뒀다. 그때 지은 시가 <얼룩송아지>로, 목월의 나이 열여덟 살 때다.

어디선가 사각사각 연필 깎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집필실. 낮은 책상 곁에는 한양대 교원증, 월급봉투, 강의노트가 친근하게 놓여 있다.
목월은 산문은 만년필로 쓰고 시는 연필을 가늘게 깎아 썼다고 한다. 산문 <나와 청록집 시절>에 목월은 “나는 늘 혼자였다. 사무가 끝나면 거리로 나왔다. 거리랬자 5분만 거닐면 거닐 곳이 없었다. 반월성으로, 오릉으로, 남산으로, 분황사로 돌아다녔다. 실로 내가 벗할 것이란 황폐한 고도의 산천과 하늘뿐이었다”고 고백했다. 목월은 세 살 위 고향 선배이자 문학적 동반자였던 김동리를 만나면서 외로움을 달랬다. 둘이 처음 만난 건 서울로 유학 간 동리가 휴학해 내려와 있던 1934년 겨울방학 때로, 이따금 황성공원을 함께 거닐며 마음을 나누었다고 한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숨 막히는 속도전 속에 찬찬히 나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땐 경주로 가자. 짧은 여정의 끄트머리에 동리목월문학관에 들른다면, 우리와 똑 닮은 희로애락을 겪었던 옛 현인들의 자취가 따뜻한 위로를 건넬 것이다.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나그네 - 박목월

동리목월문학관 관람안내
주소 경북 경주시 불국로 406-3
운영 09:00 ~ 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설날 당일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원에서 걷다가 또, 바라보다가 (0) | 2022.10.19 |
|---|---|
| 발걸음마다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함안 (0) | 2022.10.13 |
| 봉평의 메밀꽃 필 무렵 (0) | 2022.09.21 |
| 달도 머물다 가는 절경, 영동 (0) | 2022.09.15 |
| 에메랄드빛 하늘이환히 내다뵈는 통영에서 청마를 그리다, 청마문학관 (0) | 2022.09.06 |